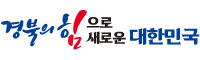청송 옹기장
- 지정 : 무형유산
- 한자명 : 靑松 甕器匠
- 유형분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 도자공예 > 도기공예
- 시대 : 역사 미상
- 지정일 : 1997-03-17
- 소재지 :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351
청송군 일대는 옹기(甕器)의 재료인 질 좋은 점토(粘土)가 많기로 전국에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파천, 송강, 부곡, 안덕 노재 등에는 오래 전부터 옹기굴이 여럿 있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이무남(李茂男) 일가의 것뿐이다. 이무남 일가는 그의 증조부대에서도 옹기일을 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 호명(鎬明)까지 5대(종명(鐘明)-춘우(春雨)-상문(相文)-무남(茂男)-호명(鎬明)에 걸쳐서 옹기를 가업으로 전승(傳承)하고 있는 집안이다. 그는 17세때 아버지로부터 옹기업을 배우기 시작하여 군 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업에 몰두하고 있다. 작업은 대정(만드는 사람)과 거내꾼(보조자)이 행한다. 제작은 5색 빛이 나는 점토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 흙은 물을 적당하게 천천히 뿌린 후 2~3일 동안 덮어서 불린다. 다음날 흙을 2~3차례 뒤집으면서 떡매로 치고 발로 밟아서 기포를 완전히 제거한 후, ‘깨기’로 얇게 긁으면서 작은 돌이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지금은 롤러를 사용하여 이 과정을 쉽게 처리한다. 이 흙을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가래떡 모양으로 굵고 길게 만들어서 물레위에 올려두고 방망이로 바닥부터 만든 후 옹기 모양으로 감아올린다. 이렇게 ‘타래미’한 것은 안쪽에 ‘도개’를 받치고 겉쪽에 ‘부채’를 두들기면서 몸통의 너비와 크기를 조절한다. 모양이 갖추어지면 ‘긍개’로 몸통 모양을 잡으면서 ‘물가죽’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다. 이렇게 완성되면 두 가닥의 천으로 ‘들보’를 하여 그늘진 건조장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가 되면 옹기를 잿물에 담근 후 소나무가지로 만든 그늘에서 약간 말렸다가 공장안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잿물은 약토 2/3와 재 1/3정도를 물과 배합하여 두 겹으로 접은 천으로 흙탕물을 여러 날 걸러내어서 만든다. 재는 소나무재가 가장 좋지만 짚재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재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좋은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재(구들장에 쌓인 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마는 예전의 일(一)자형 굴을 사용할 때 흙이 떨어지거나 유약이 녹아서 서로 엉켜 붙는 결점을 보완하여 36년 전에 현재의 굴로 바꾸었다. 지금은 여러 개의 둥근 모양의 굴을 연결한 형태이다. 그는 20평 정도와 10평 정도의 가마 2기가 있다. 불은 1,200~1,400℃까지 온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10일 정도 땐다. 나무불은 온도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옹기의 표면의 유약이 흘러내리면서 특유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그가 기름가마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방법을 고집하는 이유이다. 그가 주로 만드는 소재는 독, 뚜껑, 옹가지, 시루, 새우젓독, 설장군, 누불장군, 투꾸바리 등이다.